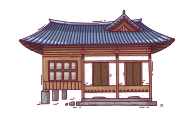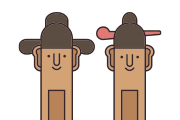「상장군공파의 자랑스러운 선조」
페이지 정보
관리자1 작성일25-02-05 18:20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
「상장군공파의 자랑스러운 선조」
朝鮮世宗때최초의謁聖試에합격한豐壤趙氏上將軍公監司公派諱注
-(酌獻禮親試乙科壯元及第戶曹參判(작헌례친시을과장원급제호조참판)-
 豐壤趙氏 上將軍公 監司公派8世 諱 注는 조선초기 문신으로 호는 도곡(道谷)이며 전라·평안양도감사를 지낸 7世 조원(趙源)의 아들이다.
豐壤趙氏 上將軍公 監司公派8世 諱 注는 조선초기 문신으로 호는 도곡(道谷)이며 전라·평안양도감사를 지낸 7世 조원(趙源)의 아들이다.
조주(趙注)는 세종11 1429년 5월 26일 작헌례 친시 을과(알성시)에 장원 급제하고 세종 11년에 의영고 부사(義盈庫副使), 세종 15년 충청도 도사(都事), 세종 16년 사간원(司諫院) 우헌납(右獻納)·좌헌납(左獻納), 세종 17년 사헌지평(司憲持平), 세종 18년 호조 종사관(戶曺 從事官)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세종22 1440년에는 경명행수자(經明行修者)로 사유(師儒)가 될 만한 인물로 천거 될 때 김숙자(金叔滋)와 함께 뽑혀 성균관 주부에 임명되었고, 호조참판을 끝으로 퇴관하고 향리로 돌아와 강진군 송월리(沙羅里)에서 거주하다가 나주시 세지면 발산에 있는 양친 조원·함양 오씨(趙源·咸陽 吳氏)의 산소를 돌보기 위해서 나주시 세지면 세화리(발산)에 이거(移居)하여 정착하고 기거(起居)하시다 나이 80세가 넘어서 생(生)을 마감한다. 公의 묘지는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414번지이다.
조주는 강진(금릉)에 살면서 연실(서재)를 지어 도암(道庵)이라 하였으며, 많은 유고(遺稿)가 있었으나 전쟁으로 소실되어 버렸고, 나주시 세화리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세지면 벽산리 475번지에 동정(東亭)이라는 서당을 짓고 만년(晩年) 동안 사용하였다.
동정의 별서(別墅) 터가 바로 벽류정(碧流亭)인데, 훗날 조주는 손자 충순위효력부위 조기(忠順衛效力副尉 趙琪)가 아들이 없자 외손자 광산김씨 김행(光山金氏 金珩)에게 별서를 양여하게 된다. 김행의 손자인 김운해(金運海 1577~1646, 號 碧流亭)는 인조8 1640년에 그 텃자리에 자신의 호를 따서 碧流亭을 건립하고 호조참판 조주의 높은학문과 인품을 기리고 또한,나주 근교의 선비들과 어울려 시문을 논했다 한다. 벽류정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주는 예문관 대제학 난계 박연(蘭溪 朴堧)의 맏딸에게 장가들어 9世 건공장군(建功將軍) 휘 단(諱)과 평안북도 벽동군수(碧潼郡守) 휘 사순(諱 士舜)을 낳았다.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153번지에 벽동군수 휘 사순의 백순재(百順齋) 재실과 뒤편에 公의 묘소가 있다. 서울에 살던 조주가 지방에서 살게 된 연유는 박연의 삼남 계우(季愚)가 단종2(1454년) 계유정난 시 단종 복위(端宗 復位) 사건에 연루되어 교형 당하고 박연은 전라도 고산(완주군)으로 귀양을 갔으며 조주 역시도 이때 귀향한다.
상장군 병오보(上將軍 丙午譜 헌종12 1846년) 4편 풍양조씨 가장 서문편에 “누이정쟁천적필두문사객(累以廷爭遷謫必杜門謝客 : 당쟁으로 유배시두문불출하고 손님을 맞지 않았으며 원망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35권 나주목(羅州牧) 인물평에는 조주는 세종때 장원급제하여 청렴하고 근면하게 벼슬을 지냈으므로 명성과 업적이 높았다. 만년에 검호조참판(檢戶曹參判)으로 물러 나와 나주의 세화리(細花里)에 살았다. 그때 나이 80여 세로 매년 동짓날과 정월 원단(元旦)의 성절(聖節)이 되면 반드시 망궐례(望闕禮)에 참석하였는데 나주성문을 들어오면 반드시 말에서 내리고 공청(公廳)으로 들어갈 때에는 꼭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사람들이 까닭을 물으니 수령은 “임금의 근심을 나눈 직책을 수행하고 성안은 수령이 있는 곳이므로 그렇게 한다.” 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국조방목(國朝榜目)』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조선시대 최초의 알성시(謁聖試)는 세종11(1429년)의 기유(己酉)에 개최하였다. 임금이 문묘(文廟)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올리고, 이어 성균관 유생(儒生)들에게 과거(科擧)를 특별히 베풀었는데, 이것이 알성시이다.
辛未/御經筵 上率王世子及百官, 幸成均館, 以冕服酌獻于文宣王, 命館官分獻四位十哲東西廡 便服御明倫堂, 命讀券官右議政孟思誠·判府事許稠, 對讀官同福 代言皇甫仁·集賢殿副提學鄭麟趾·集賢殿直提學 偰循等出題, 擬贊成權近進《豳風七月圖》箋。赴試者, 摠四百人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성균관에 행차하여 면복(冕服) 차림으로 문선왕(文宣王, 孔子의 尊號)에게 작헌(酌獻)하고 관관(館官)에게 명하여 사위(四位)·십철(十哲)에게 동서무(東西廡)로 나누어 술잔을 드리게 하고 편복(便腹) 차림으로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독권관인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 대독관(對諫官) 동부대언(同副代言) 황보인(皇甫仁), 집현전 부재학(副提學) 정인지(鄭麟趾),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설순(偰循) 등에게 명하여 출제(出題)하게 하니, 찬성(贊成) 권근(權近)이 올린 빈풍칠월도(豳風七月圖)의 전(箋)을 본뜬 것이다. 시험에 나온 사람이 총 4백 명이다.
세종11(1429년) 5월 27일 과거입격자(科擧入格者) 발표 방방례(放榜禮)는 5월 30일 거행되었다.
알성시 입격자 3인이었다.
을과(乙科) 1인 녹사(綠事) 조주(趙注) 부(父) 감사(監司) 원(源) 병과(丙科) 2인 생원(生員) 민효열(閔孝悅) 부(父) 지중추(知中樞) 대생(大生) 직장(直長) 장근지(張謹止) 부(父) 윤화(允和)
※ 豳風七月圖(빈풍칠월도) : 시경 빈풍편은 주나라 주공(周公)이 섭정을 그만두고 조카인 성왕(成王)을 등극시킨 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성왕에게 빈나라(周의 옛이름) 백성들의 생업에 대한 어려움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지은 詩, 조선왕실에서 빈풍도는 무일도와 함께 역대 통치자들에게 백성들의 노고와 고충을 생각하게 하는 교훈적 그림으로 왕도정치라는 유교 이념의 대표적인 시각적 표상이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